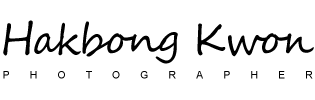The Independence Movement: Layered Gazes

독립운동: 겹처진 시선
나는 한동안 우리가 직면한 위협이 외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한 불안정은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깨달음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뿌리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 출발점은 바로 3·1 운동과 독립운동이었다. 1919년의 3·1 운동은 우리 민족이 자주 독립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세계에 알린 역사적 순간이었고, 이를 계기로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제와 민족의 자주성을 국가의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이 독립운동의 정신과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다.
이 작품은 독립운동의 역사적인 현장을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바라보며 만들어졌다. 작품 속 흰색 저고리와 검정 치마의 이화학당 교복을 입은 소녀의 모습은 유관순 열사를 떠올리게 하지만,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역사의 그늘에 가려져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포함해 모두를 상징하는 시각적 은유이기도 하다.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 공중에 부유하는 소녀의 모습으로 표현하여 현실과 비현실이 만나는 지점에서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도록 했다. 이 모습은 과거의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 시간의 흐름을 넘어 오늘의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살아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소녀가 응시하는 공간들은 독립을 향한 열망과 투쟁이 펼쳐졌던 역사적 장소뿐 아니라 서대문형무소와 같이 독립운동가들이 고통을 겪었던 장소,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의미를 가진 장소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나는 선열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고 고통받았던 이 장소들이 현재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지를 조용히 돌아보고자 한다. 만약 그들이 오늘의 우리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이 작품이 목표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더 나아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성찰하는 조용한 물음표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나는 전국에 흩어진 독립운동의 사적지를 기록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가고 싶다. 또한 국외에 존재하는 수많은 독립운동의 흔적까지 확장하여, ‘독립운동’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역사 속에 갇힌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성찰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자 사유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2025. 8. 4 편집
권학봉 씀
.
The Independence Movement: Layered Gazes
The imposition of martial law last December came as a profound shock to me. Until then, I had believed that South Korea’s greatest threats came from powerful nations like China, the United States, or Russia. But what unfolded revealed something far more unsettling: that the true danger lies not always beyond our borders, but within—among the corrupt forces entangled in our own political system.
This realization forced me to reflect deeply on the true found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It led me back to the March 1st Movement of 1919 and the broader independence movement that followed. The March 1st demonstrations marked a pivotal moment when the Korean people declared their will for self-determination to the world. Soon after,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Shanghai, embodying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national sovereignty—principles that still form the spiritual core of the modern Korean state.
This photographic work seeks to revisit the historical landscape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through a contemporary lens. The young girl in traditional school uniform—a white blouse and black skirt from Ewha Haktang—may evoke the image of martyr Yu Gwan-sun. Yet she does not represent any single individual. Instead, she stands as a visual metaphor for the countless unnamed independence activists whose sacrifices were lost in the shadows of history.
Depicted as levitating above the ground, the figure transcends physical constraints. This surreal expression is not meant to escape reality, but rather to create a space where the past and present can intersect—where the spirit of those who fought for independence still lingers in today’s Korea.
The places she gazes upon are more than just sites of historical significance; they include prisons like Seodaemun, where countless activists suffered, as well as public spaces imbued with collective memory. In this quiet act of witnessing, I attempt to ask: If our ancestors could see us now, what would they think of the country they gave everything to build?
This work is not merely a record of the past. It is a quiet question posed to the present and the future—an invitation to reflect on how we live now and what kind of future we are creating.
I plan to continue this work by documenting historical sites of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across the nation, and eventually, expanding my lens to include those beyond our borders. For the word “independence” to resonate not as a distant echo from history, but as a living concept—one that challenges us to examine our present and reimagine our future—it must begin again with a gaze.
.

기간: 2025. 8. 7. (목) – 8. 31. (일)
운영시간: 10:00–18:00 (매주 월요일, 공휴일, 일요일 휴관)
관람료: 무료
.

권학봉의 『독립운동: 겹쳐진 시선』에 부쳐
-떠오르는 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
하늘과 땅 사이, 한 여인이 떠오른다.
그녀는 날지 않는다.
도착하지도 않는다.
그녀는 다만 떠 있다
무언가를 기다리듯, 무언가를 증언하듯.
서울의 아스팔트, 충청의 들녘, 사라진 집터,
침묵하는 기념비 위에서 그녀는 몸을 들어올린다.
그 부유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한 시간과 공간, 그 경계선에 던져진 존재의 물음이다.
권학봉의 사진 연작 『독립운동: 겹쳐진 시선』은 역사적 장소와 한 인물의 공중부양이라는 극도로 절제된 장치를 통해 존재와 시간, 기억과 윤리, 몸과 국가를 하나의 프레임 안에 포개 놓는다.
작가의 시선은 과거를 단지 기록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망각의 언저리에서 말하지 못한 자들, 기억되지 않은 자들을 오늘의 풍경 위로 소환한다.
소녀는 이화학당의 교복을 입었으나, 그녀는 유관순이 아니다.
그녀는 모두이며, 동시에 누구도 아니다.
그녀는 사라진 이름들, 묻힌 목소리들, 그리고 우리 안의 잠든 윤리이다.
그녀의 부유는 신비화된 도약이 아니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의 조건,
실패한 귀환이자 미완의 현존, 그리고 역사의 틈 사이에서 잠시 떠오른 깨어 있는 질문의 몸짓이다.
사진 속 공간은 익숙한 듯 낯설다.
탑골공원, 서대문형무소, 유관순 생가, 병천오일장, 천도교 중앙대교당, 북촌의 유심당 옛터, 시장의 뒷골목, 도시의 음영진 모서리, 표지판 아래 무심한 골목.
그 공간들은 과거라는 이름으로 박제된 채, 오늘의 풍경 속에서 말없이 시간의 지층을 품고 있다.
그 위에 떠 있는 존재는 묻는다.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나는 누구를 대신하여 지금 이곳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도 독립 중인가?”
사진은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는 이들은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진동을 느낀다.
그것은 잊는다는 행위가 어떻게 반복되는지, 기억이 어떻게 정치화되고, 제도화되고, 사유의 자리에서 추방되는지,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어떻게 그것을 거스르며 다시 사유의 자리를 열어젖히는지에 대한 정교한 철학적 레지스탕스이다.
흑백으로 구성된 장면들은 ‘기록’처럼 보이지만, 실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윤리를 겨눈다.
그녀의 몸에 드리운 빛은 마치 내부로부터 발생한 듯, 존재가 스스로를 밝혀내는 형상이다.
그녀의 주변은 흐릿하거나 어두우며, 그녀만이 또렷하다.
그것은 주인공으로의 강조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고요한 불가피함이다.
이 사진들은 독립운동의 기억을 찬양하지 않는다.
오히려 묻는다.
기억은 살아 있는가?
우리는 그 정신을 감당하고 있는가?
역사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매개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과제’가 아닌가?
『독립운동: 겹쳐진 시선』은 추념의 전시가 아니다.
그것은 윤리의 호출이자, 존재의 응답이다.
부유하는 몸은 이 시대의 증언이자, 사라진 자들의 마지막 외침이다.
그녀는 결국 착지할 것이다.
그러나 어디에?
그 착지의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 질문은 아직, 우리 각자의 발 아래 머물고 있다.
권학봉의 겹쳐진 시선이 깨어진 유리병처럼 예리하게 우리를 상처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김홍희/사진가
.
.